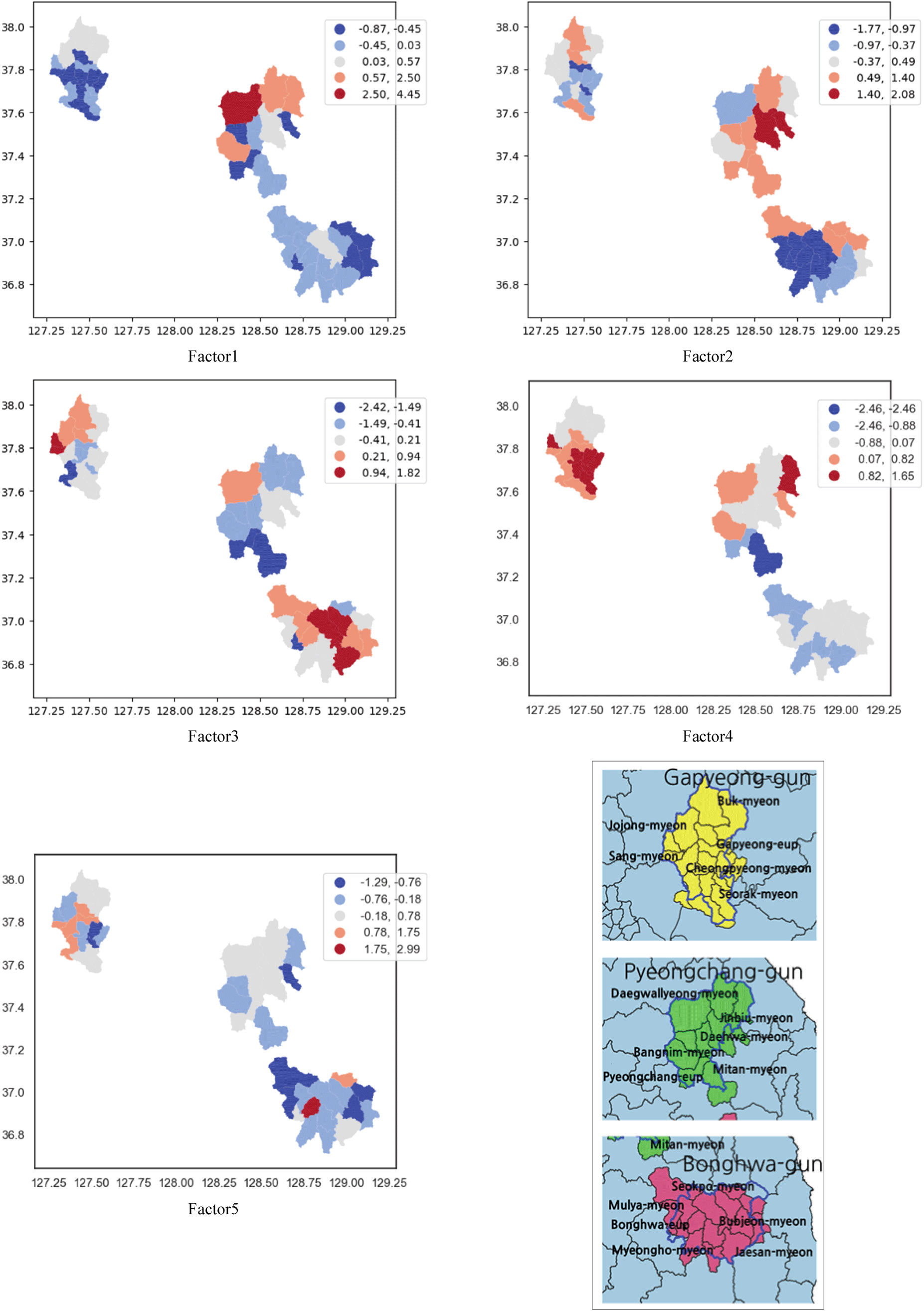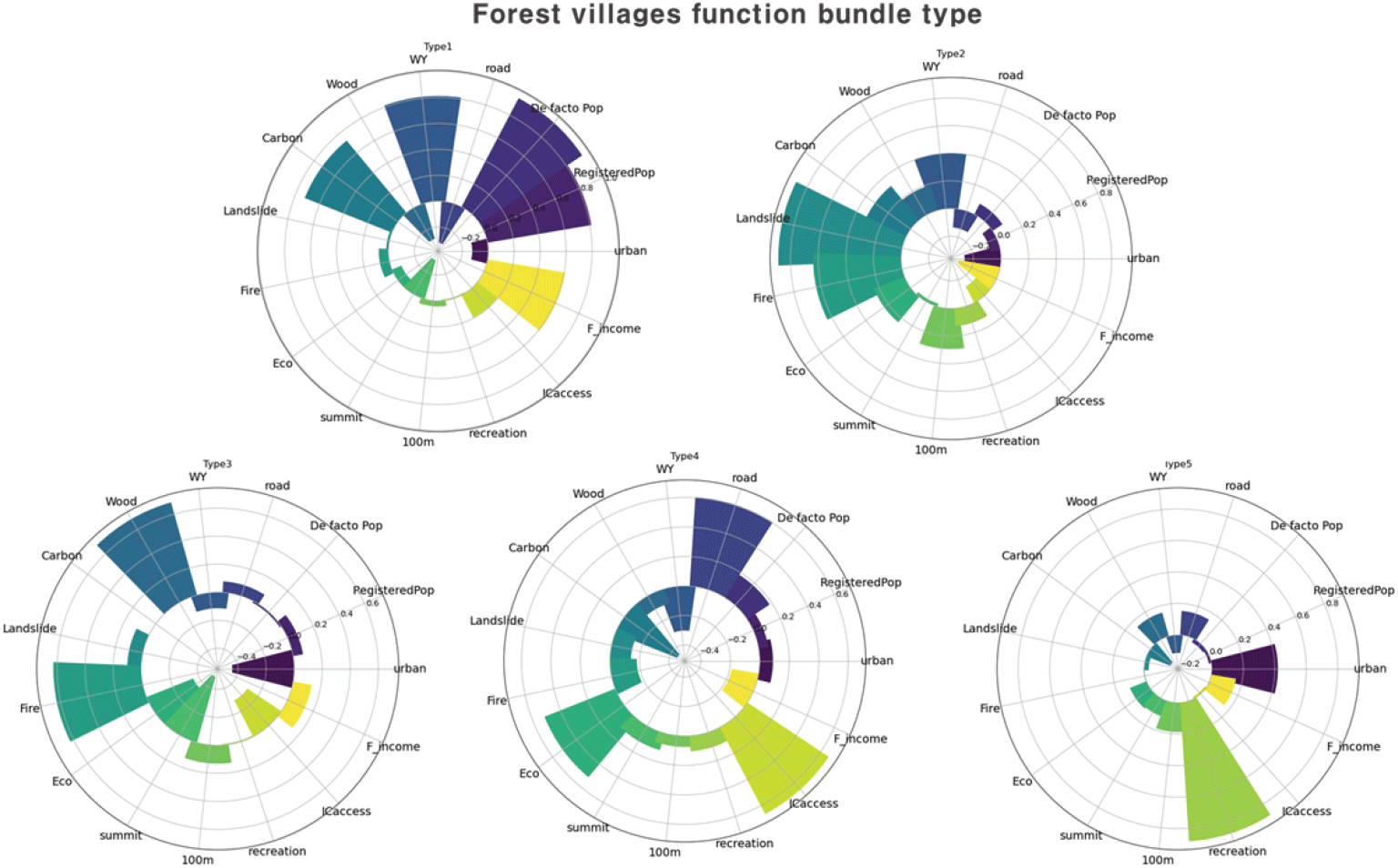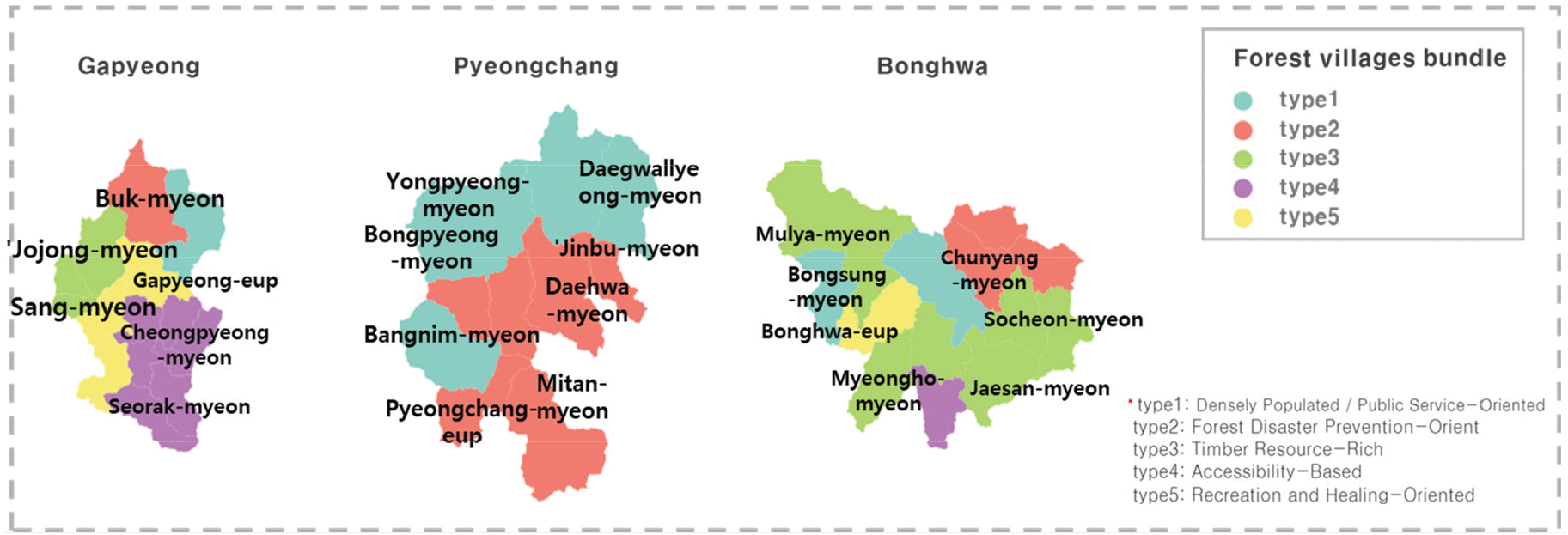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율 은 97%를 상회하는 등 높은 도심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4a). 더욱이 최근 Statistics Korea(2024a)에서 실시한 격자기반 인구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인구밀도, 연령별 인구분포, 1인당소득은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토 불균형이 유발되고 있다.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이란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을 뜻한다(시행령 제2조). 산촌은 풍부한 생태계서비스 공급원이자 국가 혹은 지방 재정 확충이 가능한 공간이다. 연구에 따르면 비교대상을 국유재산으로 한정할 경우 경기도의 재산가액은 1,313,672억원인 반면 강원도는 238,771억원에 그쳤으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경기도의 재산가액은 13,755억원에 그쳤으나, 강원도에서는 112,47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강원도에 분포한 높은 산림 면적에서 기인한다(Park, 2024). 이처럼 산촌이 지닌 자원의 가치는 잠재성이 풍부하나 이에 대한 인식부재는 산촌인구의 이탈과 지역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적인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산촌의 배후자원을 여가⋅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기회 혹은 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은 순위로 평가하고 있다(Parkins et al., 2001). OECD(2016)에 의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저밀도 경제 성장을 추구, 도-농 연계와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 핀란드의 사례로 마을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인구유입을 지양하되 마을의 자원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산촌진흥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Makkonen and Inkinen, 2023). 이처럼 마을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Son et al.(2017)은 산촌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촌 유형구분 특성을 도출한 바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산지지형, 공간연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시행이 필요한 지역을 지도로 제작하여 제시한 바 있다. 최근 Park et al.(2023)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산촌의 입지 유형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산촌의 기능은 다르게 나타났고, 이에 유형별 특성을 살려 산촌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산촌정책 마련의 필요성 제시하였다. 유형분류에는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Cho et al.(2024)는 산촌활성화지수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산촌과 관련된 삶터 지수, 일터 지수, 배움터 지수, 놀이터 지수 등 네 가지 주요 지수를 개발하여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산촌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을 구분하고, 지표를 수립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구소멸 쇠퇴산촌을 대상으로 산촌이 제공하는 자연적 혜택을 인문사회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공간적 유형화 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산림기능구분도와 같은 산림유형에 관련한 지도는 제작되고 있으나, 실제 산촌이 제공하는 혜택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지도는 작성된 바 없어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촌으로의 인구유입, 산촌진흥을 위한 참고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멸위기에 처한 한국의 산촌을 대상으로 한 산촌기능구분도의 작성 및 지역계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산촌마을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인구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생활의 영위가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내 인구 유입 유출 양상과 지역이 가진 산림생태계서비스 현황을 바탕으로 각 산촌의 유형을 파악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산촌인구 유입을 위한 산촌관리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멸위기에 처한 산촌진흥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남한의 산림은 생태권역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기온, 해양성, 지형, 지질, 역사, 토지이용패턴에 따라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생태권역에 분포하는 3지역의 산촌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1). 가평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중부산야권역에 속하며, 평창은 높은 해발고에 위치한 산악권역에 속하고, 봉화의 경우 소백산맥지대에 위치하는 남동부산야권역에 속한다. 세 권역 중 산악권역의 기온이 다른 권역에 비해 평균 4.5도로 현저하게 낮다. 산촌의 유형을 구분하기에 앞서, 산촌이 속해있는 행정구역별 산림기본통계와 사회/경제적 현황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 내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봉화에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산림 분포면적은 평창에서 119,088 ha로 가장 높았다. 국유림 비중은 평창에서 58.1%로 가장 높았고, 가평에서 13.5%로 매우 낮았다. 특히, 시도별 산주 수는 세 대상지 중 평창군에서 가장 많았고, 사유림 산주의 관 외 거주자수 또한 평창군이 속한 강원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경기에서는 관내 거주자수가 57.8%로 전국에서 비교했을 때 높은 축에 속하나, 강원이나 경북의 경우 각각 37.2% 혹은 37.9%로 낮은 축에 속했다. ha당 임목축적은 평창에서 187.43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평균 165.2 ha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세 대상지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다른데, 가평이 가장 가깝고, 평창은 그다음, 봉화는 먼거리에 위치해있다. 인구현황의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체류인구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나는데, 가평과 평창은 그 배수가 7을 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총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이다. 세 지역의 산촌소멸등급 은 모두 고위험군에 속하여 전국 소멸산촌대상지로 지정되어있다. 특히,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모바일 자료 기반 생활인구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활력을 나타내는 6개의 항목(①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②타시도 거주자 체류 비율 ③재방문율 ④평균 체류일수 ⑤평균 숙박일수 ⑥평균 체류시간)에 대해 경북지역과 강원지역은 대체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의 활력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Statistics Korea, 2024b).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의 잠재성이 존재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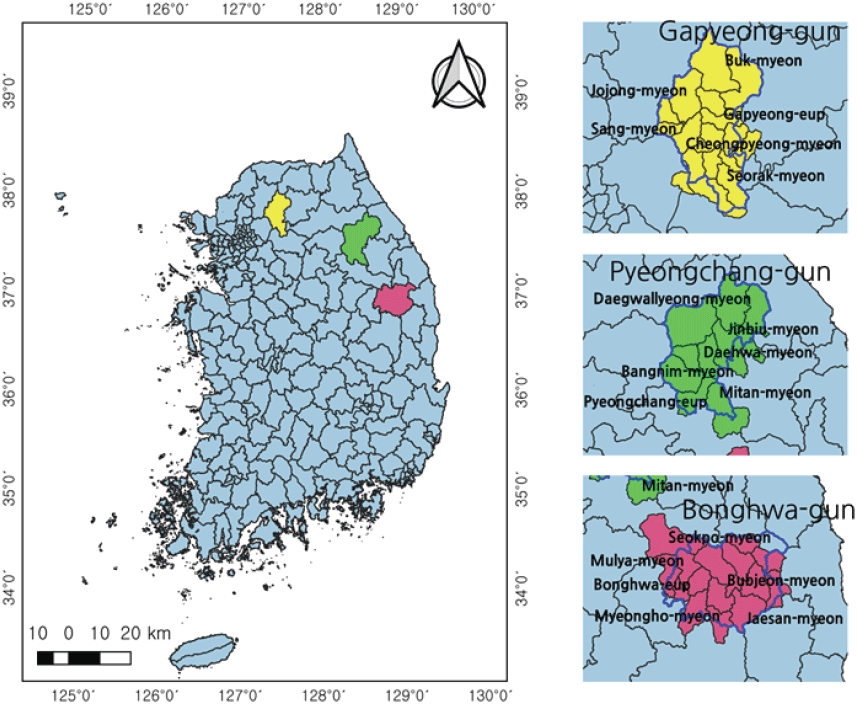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와 인구사회학적 인자를 기반으로 산촌을 유형화하기 위해 산림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입력자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GIS 모델링 혹은 생태계서비스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의 선정에는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였다(United Nations, 2015). 특히, UN의 지속가능성 목표 가운데 사회, 경제적인 인자에서 더 나아가 환경 생태적인 인자를 함께 고려하여 균형있는 산촌유형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인자로서 도시와의 접근성, 인구수, 도로접근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도시와의 접근성 혹은 도로접근성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GIS 분석을 통해 raster격자로 변환하였다. 인구수의 경우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구별하여 적용하였는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자료가 분석하려는 대상지보다 상위 행정경계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GIS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작성되어 있는 인구 통계값을 fishnet기법으로 100 m 격자를 작성하여 격자 하나마다 차지하는 시가화지역 비율만큼 사람이 거주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해당 비율만큼 인구를 할당하여 유추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개별 지자체의 인구합과 유추된 인구합이 동일하도록 절차상에 포함시켜주었다.
다음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 항목은 공급, 조절, 지지, 문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공급서비스의 경우 산림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량공급서비스와 산림의 자원건전성을 판단하여 목재를 공급할 수 잇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각각 InVEST Model과 임상도를 활용한 GIS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조절서비스의 경우 탄소저장능력(기후조절), 침식조절, 산불조절 능력을 평가하였는데, 탄소저장능력의 경우InVEST Model을, 침식과 산불조절능력의 경우 국가에서 제작한 위험등급도를 적용하였다. 지지서비스는 국립생태원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였고, 문화서비스의 경우 산마루 접근성을 활용한 경관가치,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명산의 분포와 산림휴양시설 분포를 적용한 관광서비스,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평가한 배후시장요소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본 평가인자들을 다음 통계분석에 적용함에 있어 지역 내, 지역 간 비교를 위해 3개 대상지 전체 값을 대상으로 0부터 1사이로 표준화하였고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3개 산촌 대상지 간 비교 및 개별 산촌지역 내 기능구분과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평가자료는 결국 래스터로 변환되었고, 인구자료만 100 m 격자, 다른 자료는 30 m 격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개별 평가인자의 분석 이후 산림유역도를 통해 3개의 대상지의 소유역별 점수를 도출해 주었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위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3).
| Major Category | Subcategory | Data or Evaluation Technique | Description and Analysis Method | Data Source | ||
|---|---|---|---|---|---|---|
| Socio-Economic Factors | Urban Accessibility | Urbanized Area Boundary | Applied Euclidean distance based on the boundary of urbanized areas: closer = closer to 1, farther = closer to 0 |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rtal (2022) | ||
| Population | Resident Population | Population data compiled at the county level is allocated based on the proportion of urbanized area within 100m grid | Statistics Korea (2024) | |||
| De facto Population | ||||||
| Forestry Income | Forestry Management Entity Data | Estimated forestry income based on registration status (forest area) of forestry management entities | KFS (2024), Private Forest Management Division | |||
| Road Accessibility | Forest Road Network, National Road Link | - | KFS, National Transport Info Center (2021) | |||
| Ecosystem Services | Provisioning | Water Supply | InVEST WaterYield Model | Land Cover Map | 2019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 Ministry of Environment (2020) |
| Annual Precipitation | Interpolated map based on 10-year average rainfall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23) | ||||
| Annual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 Approximate values between 1950–2010 | CGIAR-CSI (2023) | ||||
| Soil Water Content | Amount of moisture available to plants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3) | ||||
| Effective Soil Depth | Depth limit for vegetation roots; Forest Site Classification and Soil Map | KFS, WAMIS (2023) | ||||
| Watershed Map | - | WAMIS | ||||
| Seasonal Factor | Applied value of 15 using average number of rainfall days | Sharp et al. (2020) | ||||
| Biophysical Coefficient | Determined by land cover types | Sharp et al. (2020) | ||||
| Timber | Forest Healthiness (Forest Type, Site Quality) | KFS (2021) | ||||
| Regulating | Climate Regulation | InVEST Carbon Model | Land Cover Map | Land cover classification for 1989, 2009, 2019 | Ministry of Environment | |
| Biophysical Coefficient | Carbon sequestration coefficient by land cover types, modified based on Sharp et al. (2020) | Sharp et al. (2020) | ||||
| Erosion Control | Landslide Risk Map | Applied 5-grade risk rating | KFS (2019) | |||
| Forest Fire Regulation | Forest Fire Risk Map | Applied 5-grade fire risk rating | KFS (2022) | |||
| Supporting | Ecosystem Quality | Eco-Natural Map | Evaluation of flora, fauna, wetlands | Ministry of Environment (2023) | ||
| Cultural | Landscape | Ridge Accessibility | Euclidean distance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20) | ||
| Tourism | 100 Famous Mountains | Euclidean distance | KFS | |||
| Forest Recreation Facilities | Arboreta, forest bathing parks, healing forests, etc. | KFS (2022) | ||||
| Market Accessibility | Highway IC Accessibility | Euclidean distance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20) | |||
| Boundary | Forest Watershed Area | Integrated Forest Management Zone (eup/myeon unit)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3) | |||
To enable comparative evaluation across the three study areas, the factor scores were standardized to a range between 0 and 1 within each region. This standardization facilitated the identification of functionally dominant characteristics unique to each region, while also allowing for the spatial analysis of prevailing functions within sub-regional units.
본 연구에서는 산촌을 지정하는 공간적 단위가 현재 “읍면”이지만, 산촌기능구분을 위한 공간적 단위는 “유역”단위가 합당하다고 여겨 이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동일한 지역일지라도 공간의 규모 혹은 경계모양에 따라 raster기반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Sclae effect”를 참고하였다(Hein et al., 2006). 무엇보다도, 생태계서비스 공급은 산줄기와 직결되기에 해당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법론의 맥락에 맞추어 산림유역도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이에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통합산림권역 읍⋅면 자료를 활용하였다(Son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와 생태계서비스 분석 결과 항목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끼리 성분(요인)으로 집약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도 오차항을 포함하지 않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잠재 변수의 의미 추출을 위해 요인 회전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요인 적재 값(요인간의 상관계수)을 통해 변수들이 어느 요인에 상대적으로 높게 적재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상관관계=0)이라는 가정하에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선택하였다. 베리맥스 회전 방식은 요인 행렬의 각 열(요인)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각 요인의 분산이 극대화되기에 요인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Kaiser, 1958). 요인분석 후 회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분 행렬과 회전을 거친 회전 성분 행렬을 비교하면 후자에서 요인 구조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요인분석 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도시와의 접근성은 봉화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생활인구 수는 가평에서 가장 많았으나, 인구밀도는 평창에서 높았고, 평창에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율이 7배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창이 속해있는 상위 행정구역인 강원도의 경우 통신 모바일 자료를 활용한 인구추정 자료에 의하면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강원에서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구감소지역 평균 3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평창은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24b). 특히 용평면 및 봉평면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접근성의 경우 가평에서 도로나 임도와의 거리가 가깝게 분포하는 현황을 보인다.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의 경우 수량공급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26 m3 공급을 나타낸 봉평면 지역이었다. 이외에도 평창지역은 수량공급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평은 해당 기능이 저조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목재생산 잠재력은 봉화지역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며, 가평지역에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조절서비스 중 기후조절서비스를 크게 나타내는 지역은 탄소저장능력이 6331 ton인 평창군 봉평면 지역이었다. 이외에도 평창은 탄소저장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평에서 해당 기능이 저조하게 분포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림이 제공하는 고유기능인 목재생산능력과 탄소저장능력은 약한 상반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문화서비스에 해당하는 100대 명산이나 휴양시설의 경우 가평에서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임업소득의 경우 평창에서 임업경영체 개수소 및 면적이 넓었으며, 소득도 높게 나타났다. 목재 생산 잠재력이 높은 봉화에서는 임업소득이 다소 부진한 수치를 보였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평창에서 임업소득도 함께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지역의 사회, 경제, 생태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2). 그 결과, 수량공급, 목재생산, 탄소저장, 재해위험성 항목들은 도시화정도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인구수 자료의 경우 수량공급 및 탄소저장기능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도로와의 접근성 항목의 경우 수량공급, 탄소저장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목재생산 기능과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수량공급은 탄소저장기능과 큰 양의 상관을 보였고, 목재생산기능은 약하지만 탄소저장기능과는 음의상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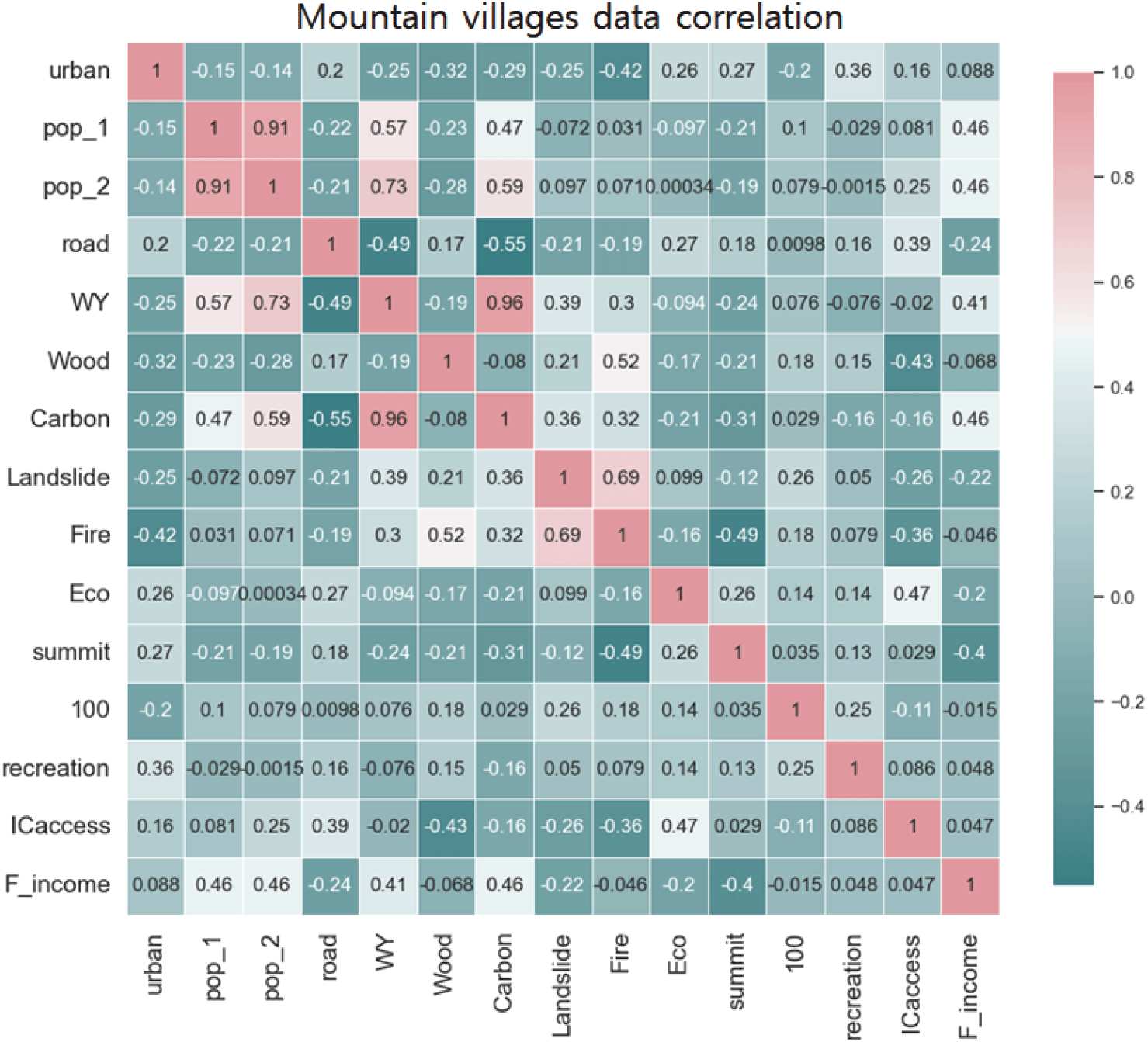
이외, 산사태나 산불 조절기능과 같이 재해조절 항목들은 산마루접근성과 음의상관을 보여 재해 위험이 큰 곳(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산마루가 분포한다는 현장의 실정을 잘 반영하였다. 생태계 질이 뛰어난 곳이 IC 접근성과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이유는 보통 IC가 도심 외곽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0대 명산과 휴양기능은 양의 상관을 보여 100대 명산이 관광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개 지표, 41개 소유역(읍면단위)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KMO = 0.534로 도출되어 그 수치가 0.4이상이므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어 eigen value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는데, ([4.19647073, 2.78912538, 1.72308701, 1.35075623, 1.19561414, 0.99909335, 0.69148357, …]) 이 중 통계적 유의성을 따르기 위해 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요인의 수만큼 추출하여 요인 수를 5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5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요인1의 요인가를 살펴본 결과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가 각각 0.81, 0.95로 도출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수량공급이 0.81, 탄소저장이 0.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발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업소득 또한 0.6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도로와의 접근이나 산마루 접근성은 낮은 요인가를 지녔다. 요인2의 요인가를 살펴본 결과 침식조절 및 산불조절 지표가 각각 0.89, 0.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 지표는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것으로 입력되었기에 재해위험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임업소득은 –0.30으로 낮은 요인가를 지녔다. 요인3의 요인가를 살펴본 결과 목재생산능력이 0.69로 높은 요인가를 지니고, 산불조절 기능이 0.63으로 높은 값을 지녀 해당 지역은 자원의 건전성이 뛰어난 만큼 산불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산마루 접근성은 –0.49로 낮은 요인가를 지니며, 도시와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요인4의 요인가를 살펴본 결과 도로와의 접근이 0.60, IC 접근이 0.66으로 대체로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태계질의 요인가가 0.52로 높게 도출되었다. 반면 탄소저장은 –0.45, 수량공급은 –0.30으로 공익적 기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요인5의 요인가를 살펴본 결과 휴양치유가 0.88로 매우 높게 도출되었고, 도시와의 접근이 0.42로 비교적 높게 도출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휴양시설이 발달된 곳으로 해석되었다. Figure 3는 요인분석의 결과를 개별 요인에 따라 공간화한 결과, Table 4는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지표별 요인가를 나타낸다. Figure 4는 개별 요인에 대한 요인가를 알아보기 쉽게 누적형 바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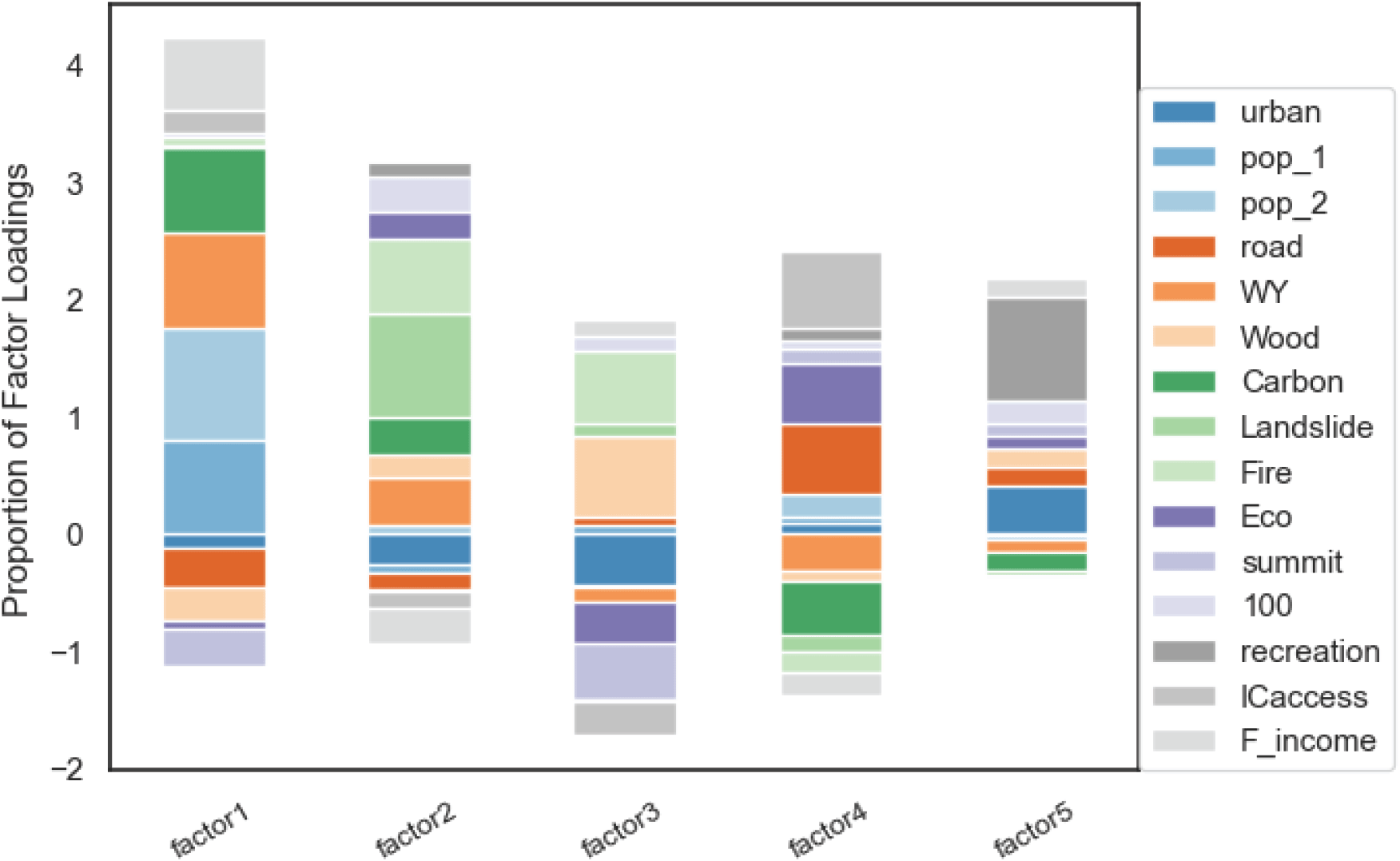
앞선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5가지 요인에 대해 각 요인별 명칭을 인구밀집, 공익기능 발달형인 type1, 산림재해 방재림 요구형인 type2, 목재자원 풍부형인 type3, 접근 용이형인 type4, 휴양치유 발달형인 type5와 같이 부여해주었다. 평창의 경우 type1과 type2만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은 용평면과 봉평면을 중심으로 체류인구가 크게 발달하였고, 생태계서비스 항목 중 조절 서비스가 우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며, 아래지역은 산림재해 위험이 높아 방재림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의 경우 type4와 type5로 나타나는 읍면이 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외곽부가 접근이 용이하여 중심부에 휴양치유기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의 경우 type3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은 목재자원 생산의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Figure 5의 경우 각 type별 지표의 고-저 양상을 번들로서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6은 세 지역의 최종 산촌기능구분도를 나타낸다. Figure 6의 경우 개별 소유역에 대해 요인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type을 추출하여 대표기능으로 부여한 산촌의 대표 기능구분도라고 할 수 있다.
목재생산 잠재력은 봉화군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며 가평군에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조절서비스 중 기후조절서비스를 나타내는 탄소저장능력은 6,331 ton 저장을 나타낸 평창군 봉평면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평창군은 탄소저장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평군에서 해당 기능이 저조하게 분포하였다.
세 지역의 사회, 경제, 생태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량공급, 목재생산, 탄소저장, 재해위험성 항목들은 도시화정도와 트레이드 오프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시화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위협요소라고 언급한 점과 유사하다(Holt et al., 2015, Chen et al., 2016, Mach et al., 2015).
한편, 본 연구에서 인구수의 경우 수량공급 및 탄소저장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조절서비스가 저조하다는 결과로 기술되고 있다(Fei et al., 2016).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주로 도시화가 잘 이루어져있으며 분석에 활용한 인구자료가 등록 인구에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하여 체류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변 산악지형을 바탕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 사계절 휴양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발달한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문화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체류인구가 발달하였으며(봉평면, 2024), 더불어 풍부한 산림을 바탕으로 높은 조절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는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게된다. 결과적으로, 도⋅농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류인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절서비스가 발달한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도로와의 접근성 항목의 경우 수량공급, 탄소저장과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나타냈으나 목재생산 기능과는 시너지 관계를 보였다. 이는 목재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임도와 근접해 있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수량공급은 탄소저장기능과 큰 시너지를 보였고, 목재생산기능은 탄소저장기능과는 약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보였다. 이외, 산사태나 산불 조절기능과 같이 재해조절 항목들은 산마루접근성과 음의상관을 보여 재해 위험이 큰 곳(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산마루가 분포한다는 현장의 실정을 잘 반영하였다. 생태계 질이 뛰어난 곳이 IC 접근성과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이유는 보통 IC가 도심 외곽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100대 명산과 휴양기능은 양의 상관을 보여 100대 명산이 관광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결과는 피어슨상관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factor1의 경우 탄소와 WY가 높고, 반면 목재생산기능은 저조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피어슨상관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산림이 제공하는 고유기능인 목재생산능력과 탄소저장능력은 상반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acotr1경향이 높은 평창군은 자연 혹은 인공적으로 조림된 소나무가 주요 수종이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지 않아 목재생산 잠재력이 낮고, 반면 탄소저장능력과 직결되는 임목축적의 경우 우월했다. 이와 반대로, 봉화군의 주요 수종은 굴참, 낙엽송, 고로쇠와 같이 경제성이 높은 반면, 임목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산림율이 우세한 지역에 속하는 두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생태계서비스에 특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분석된 4개의 요인들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세 개의 산촌을 대상으로 기능을 유형화한 결과 총 5가지의 번들이 도출되었다. ①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공(해당 번들은 탄소저장이나 수량공급기능이 우수했고,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임업경영체의 소득이 높았으며, 높은 인구밀집을 보였음) ②산림의 재해방지림 필요지역(해당 번들은 산사태나 산불위험성이 큰 곳으로 방재림이 필요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도시화 정도는 미약했음), ③산림의 목재자원생산의 잠재력 우수지(자원건전성이 높고 산마루와도 멀리 위치하며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적어 목재자원생산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했으나, 자원의 건전성이 높은만큼 산불위험성도 높게 나타남) ④접근성 우수지(IC접근성과 도로접근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⑤휴양관광 가치 및 편의 풍부(도시와의 접근성이 높고, 휴양시설이 발달하여 휴양객들이 편의를 누리며 관광할 수 있는 지역임). 평창에서는 첫 번째 번들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봉화에서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번들이 주로 나타났으며, 가평에서는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번들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세 개의 시범대상지로 산촌을 평가하고 유형화한 결과, 현재 상황에 알맞은 진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로 평창은 현재 체류인구 배수가 발달되어 있는 생활인구 양상을 유지하되, 풍부한 생태계서비스 공급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지방인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하게 축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akkonen and Inkinen, 2023). 이에, 무리한 인구유입이나 등록인구 수 증가를 위한 정책보다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중심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정책이 아닌 시민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적용한다. 실제 주민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공원, 도서관, 공동 주택을 관리한다든가 직접 공공 공간을 관리하고 지역 기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관내 거주 산주가 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령, 사유림 산주로 하여금 현재 마련된 ‘숲경영체험림’(KFS, 2023)과 같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컨설팅 기회를 높이는 등 산주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림이 제공하는 조절능력인 탄소저장과 수량공급이 발달하여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교부금 제도를 확장시켜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유림양여 제도는 보호가치가 있는 국유림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는 지역주민에 대해 임산물 채취와 같은 임업소득 창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확장시켜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공급력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역주민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지역 혹은 기업까지 확장시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풍부한 공익기능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가평은 수도권과 인접하였다는 점에서 귀촌을 통한 등록인구 유치와 주민들의 생태관광 경영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문화서비스의 동반상승(synergy) 효과를 유도한다. 가평은 산림면적이 넓고 생물다양성이 발달함과 동시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바, 수도권 거주자들의 생태관광지로서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Lauf et al.(2014)에 의하면 도시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부족하여 두 인자가 상쇄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산촌지역과 연합을 통해 부족한 생물다양성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수도권의 높은 도시화로 인해 저해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산촌지역과의 연합을 통해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가평 인근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귀산촌 시 안정된 정착을 도모하는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보전산지의 개인 산주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의 적극적인 완화를 통해 사유림 경영, 귀촌을 지원해야 한다.
봉화는 현재 등록인구가 많고 목재자원의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인근 대도시 혹은 각종 자원의 공급을 요하는 외부 도시와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역부흥을 꾀할 수 있다. 가령, 봉화지역의 우수한 품질의 목재를 대도시권에서 활용하여 목조건축물을 지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혹은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봉화지역과 협약을 통해 해당지역 목재를 각종 산업에 활용할 경우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ESG경영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봉화지역의 임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젊은 층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Hospers(2014)에 의해 제안된 쇠퇴지역의 스마트한 축소방향성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지역의 단점 개선보다 지역의 장점 극대화에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하게, 봉화지역도 현재 공급서비스 잠재력이 높지만, 수익 창출은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자원 활용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제안한다. 동시에 수도권 지역과의 연합을 통해 도농상생을 꾀하는 전략으로 유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하나의 시⋅군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번들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일괄적인 계획수립 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내에서 유연한 진흥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 론
본 연구는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하여 산촌에서 발현될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산촌 유형을 도출하였다. 기존 지역계획 혹은 산촌 진흥정책에서는 다소 정성적인 접근에 집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대체로 정량적 접근 하에 진행되어 공간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다기능성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요인분석 방법론은 세 지역이라는 시범 분석 대상지를 대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위계상 불일치하는 점이 보인다. 즉, 대상지의 개소수나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통계분석 방법론은 대규모 대상지, 많은 개소수의 대상지에 적용되어야 위계상 위화감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범 연구로써 향후 본 방법론이 다양한 전국 시 군의 그리고 수백개소의 산촌에 적용된다면 실효성을 보여줄 것이며, 유형별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분석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문화서비스의 지표로 산림휴양시설 중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위주로 활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 밖에 스키장, 골프장 등 사유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기존 산촌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적⋅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산촌 유형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역(지자체) 주도의 산촌진흥사업 추진 시 ‘산촌다움’에 기반한 유형별 기능 강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3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28~2037)을 비롯한 농산촌 공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며, 향후 산촌공간계획제도 및 산촌공간 기능구분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되었고(KFS, 2023), 이를 활용하여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의 배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MOIS, 2025)을 통해 인구감소 지자체별로 산촌지역에 대해 산지전용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다양한 여건에 처해있는 산주를 고려한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도농상생을 위한 실질적 메가시티전략을 구상함으로서 지역불균형 및 소멸위기에 직면한 산촌의 진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촌기능구분도는 우리나라 산촌이 지닌 사회⋅경제⋅생태계서비스 측면의 기능과 가치를 공간적으로 제시하여 산촌의 스마트한 쇠퇴를 통한 안정적 지역경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