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변화와 함께 국·내외에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은 지구생태계에서 가장 심각한 산림 재해를 초래하는 산림교란(forest disturbance) 인자의 하나로 임목의 고사 같은 생물적 요인(biotic factors)과 토양특성 같은 비생물적 요인(abiotic factors)에 상당한 변화와 함께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om and Seidl, 2015). 특히 산불피해지의 입지환경 및 토양특성은 생태계 복원력(ecosystem reconstruc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에 따른 토양특성 변화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Certini, 2005; Keeley, 2009; Alcañiz et al., 2018; Agbeshie et al., 2022). 산불피해지는 토양입자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입단구조가 파괴되거나 토양층위 내 불투수층 발생으로 토층 하부로 수분이동이 불량해지고(Alcañiz et al., 2018), 토양 입경분포, 토양용적밀도, 토양수분함량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Agbeshie et al., 2022). 토양 화학적 특성으로 유기물층의 탄화된 재에 포함된 염기성 이온의 세탈이나 산불발생 동안 고온에 의한 유기물의 연소 과정에서 유기탄소, 질소, 인 등의 휘산(volatilization), 탄화된 재 등에 포함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염기성 양이온의 증가 등이 관찰된 바 있다(Murphy et al., 2006). 한편 토양생물의 영양원 및 에너지원인 유기물층의 소실은 산림생태계의 종다양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Certini, 2005; Neary et al., 2005).
국내에서 조사된 산불 발생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로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 내 소나무 임분의 산불 강도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Kim et al., 1999), 산불발생 후 토양 양분함량의 경시적 변화(Won et al., 2006), 산불발생지 토양의 영양염류 동태(Cha and Shim, 2015)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산불 발생에 따른 광물질 토양층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으며(Kim et al., 1999; Cha and Shim, 2015), 산불발생 시 가장 크게 피해가 발생하는 유기물층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산불발생지의 유기물층에 대한 연구로 미국 네바다의 제프리소나무(Pinus jeffreyi) 임분의 유기물층 내 탄소와 질소량은 31~61%까지 감소하였으며(Murphy et al., 2006), Nave et al.(2011)은 온대 산림지역 유기물층의 탄소 및 질소 저장량의 산불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100년에서 13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산불피해지의 유기물층이나 토양층의 양분 저장량이 산불 피해 강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합천군 소나무 임분의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유기물층 및 토양층의 양분 농도와 저장량이 산불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서산리로 이 지역은 2023년 3월 8일 오후 산불이 발생하여 약 179 ha가 소실되었다. 산불발생지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합천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016 mm yr−1이고 연평균 온도는 13.2°C (KMA, 2022)로 우리나라 온대남부 산림대에 속한다. 조사지는 V영급의 소나무가 순림으로 우점하며 산림토양은 편마암상 화강암(Gneissose Granite)을 모재로 생성된 갈색건조산림토양형(B1), 갈색약건산림토양형(B2), 적색계갈색약건산림토양형(rB2)이 분포하나 토양 층위 발달이 빈약하고 전 토심은 30 cm 이내였다. 현지 조사는 산불 발생 약 한 달 후인 2023년 4월 10일 실시하였다. 산불피해지는 수관화나 지표화 등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형태에 따라 강산화지, 약산화지, 비산화지로 구분하였다. 강산화지는 유기물층뿐만 아니라 상층수관 전체가 소실된 지역, 약산화지는 산불의 강도가 약하여 지표면의 유기물층과 수간의 일부가 탄화되고 수관이 열에 의해 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녹색의 수관을 보이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Keeley, 2009). 각 조사구는 3개의 10 m×10 m로 구획하고 입지환경 요인 및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산화지는 산정 부위의 남향에 위치하며 경사는 20°이내였고 약산화지는 산복의 북동사면에 경사는 20°이내, 비산화지는 남동향에 경사는 15°이내의 산복에 위치하였다(Figure 1). 강산화지와 약산화지는 산불 이후 5회 발생한(3월 13일, 14일, 20일, 31일, 4월 6일) 67 mm 정도의 강수로 인하여 유기물층의 탄화물 및 재는 표면 침식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4월 현지 조사 시 산화지는 하층식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산화지는 노간주나무(Juniperus rigida A.et Z.)가 우점하며, 진달래(Rhododendron micranthum Turcz.),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BL.), 산초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청미래덩굴(Smilax china L.) 등이 식별되었다. 조사지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매목조사로부터 얻어진 흉고직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경상남도 소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개발된 상대생장식(Kim et al., 2017)을 이용하였다.
각 조사구에 임의로 선정된 2지점으로부터 900 cm2(30 cm×30 cm) 면적을 가지는 정사각형 틀을 이용하여 광물질 토양층 상부까지의 시료를 채취하고 지퍼백에 밀봉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강산화지의 유기물층 시료는 대부분 흑색으로 탄화되어 있었으며, 약산화지는 탄화물과 산불발생 시 열에 의해 변색된 갈색의 피해 잎이 탄화물 위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채취된 유기물층 의 pH는 시료 5 g에 초순수 25 ml를 첨가한 혼합액으로부터 이온전극이 부착된 pH 메터(K2200-pH, ISTEC, Korea)로 측정하였다. 유기물층의 양분 분석 시료는 65°C 온풍 건조기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 후 분쇄기로 곱게 분말을 만든 후, 0.420 mm 체(ASTM No. 40)를 통과한 시료로 유기탄소(C) 및 질소(N) 농도를 원소분석기(Thermo Scientific, Flash 2000,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농도는 0.5 g의 시료를 470°C에서 4시간 동안 회화 후 5 M HCl을 3 ml 첨가하고 질산 0.25 mL 희석하여 용액을 추출하였다(Kalra and Maynard, 1991). 추출된 용액은 ICP-OES(Optima 8000, Perkin Elmer, Shelton CT, USA)를 이용하여 이들 양분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산불 피해 강도별 유기물층의 양분 저장량은 유기물층의 건중량에 양분 농도를 곱하여 ha당 저장량으로 환산하였다.
토양 시료는 유기물층 시료가 채취된 지점의 토양을 대상으로 400 cm3 원통형 토양 채취기를 이용하여 0~10 cm 깊이에서 토양용적밀도와 양분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토양용적밀도는 105°C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한 후 토양용적밀도를 계산하고 2 mm 체를 이용하여 석력을 분리한 후 세토의 용적밀도를 계산하였다. 토양 특성 분석용 시료는 일주일 이상 풍건한 후 2 mm 체(US standard No. 10)로 선별하였다. 토양 입경 분포는 비중계법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침강 속도와 측정시간을 보정하여 모래, 미사, 점토함량을 USDA 토양 입경 분포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Kalra and Maynard, 1991). 토양 pH는 1:5(토양:초순수) 혼합액으로부터 이온전극이 부착된 pH 메터(K2200-pH, ISTEC, Korea)를 이용하였다. 토양 양분 분석 시료는 2 mm 체로 선별한 토양 시료를 0.420 mm 체를 이용하여 시료를 조제한 후 Vario Macro Elemental Analyzer (Elemental Analysensysteme GmbH, Germany)로 유기탄소와 전질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토양 내 유효 인, 교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 농도는 2.5 g의 건조 토양에 암모늄 아세테이트 용액 55 ml를 첨가하여 16시간 동안 추출한(Kalra and Maynard, 1991) 용액을 ICP-OES (Optima 8000, Perkin Elmer, Shelt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 호흡량 측정은 각 조사구 내 토양 시료 채취지역으로 약 1 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내부 직경 20 cm, 높이 11 cm 원통형 PVC collar를 광물질 토양층 1~2 cm 깊이까지 매설한 후, LI-8100A(LICOR Bioscience, Licoln, NE, USA)에 20 cm survey chamber인 opaque closed chamber를 연결한 후, IRGA(infrared gas analyzer)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토양 내 양분저장량은 세토의 토양용적밀도를 계산한 후(식 1), 토양 양분 농도, 세토의 토양용적밀도, 토양 시료 채취 깊이(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Poeplau et al., 2017).
수집된 자료의 처리별 유의성은 SAS의 일반선형모형에 의해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 검정은 Tukey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9.2 소프트웨어로 실시하였다(SAS Institute, 2003). 산불피해지와 비산화지 사이 토양호흡과 토양 특성 사이의 관계는 Canoco 5.1 (ter Braak and Śmilauer, 2018)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불피해지의 임분밀도는 약산화지 1,600 본 ha−1, 강산화지 1,333 본 ha−1, 비산화지 1,266 본 ha−1 순이었다(Table 1). 평균 흉고직경, 수고, 흉고단면적 합 및 임목 바이오매스에 의한 탄소 저장량은 산정부에 위치하였던 강산화지가 산복부에 위치한 약산화지나 비산화지에 비해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평균 수고는 강산화지가 8.9 m로 약산화지 15.8 m나 비산화지 11.7 m에 비해 작아 산림생산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사료되었다. 조사 당시 강산화지는 직경이 큰 가지를 제외하고 소지나 잎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으며 약산화지는 수관 하부 일부 잎이 변색되거나 수간 부위만 산불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었다. 유기물층의 건중량은 비산화지가 18.7 Mg ha−1, 약산화지 7.5 Mg ha−1, 강산화지 5.6 Mg ha−1으로, 강산화지는 탄화물과 재가 분포된 반면 약산화지는 탄화물과 재 외에도 산불발생 동안 열에 의해 변색된 잎 등이 탄화물 위에 유입되어 있어 강산화지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1.2 m). Standard errors in parenthesis. The values of tree biomass were calculated from allometric equations based on DBH (Kim et al., 2017).
유기물층의 pH는 약산화지 pH 6.66, 강산화지 pH 7.42로 비산화지 pH 4.57에 비해 pH 2.0~2.8 단위 높았다(Figure 2). 산화지 내 pH 증가는 탄화물이나 재 등에 포함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염기성 이온의 농도가 대조구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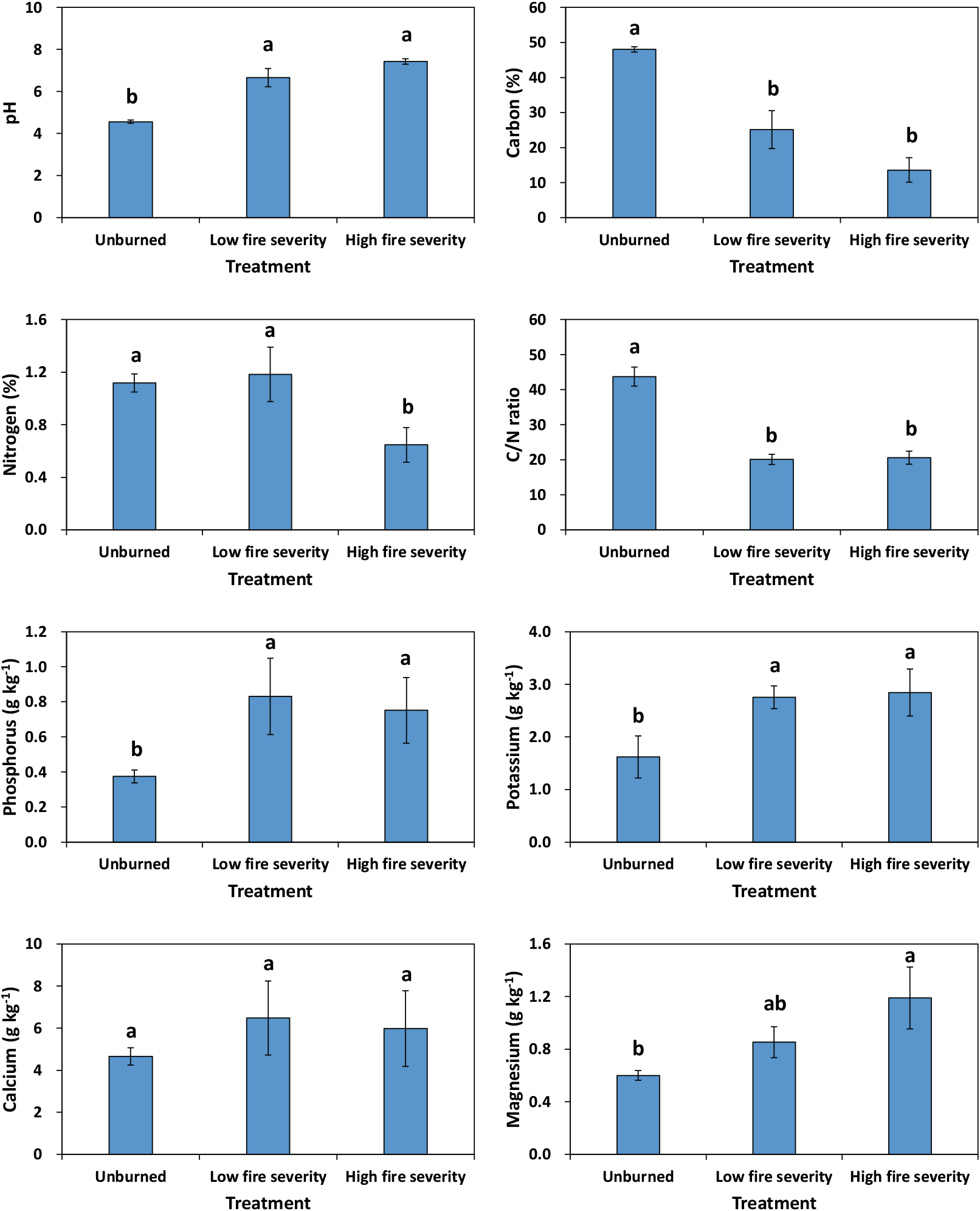
유기물층의 유기탄소 농도는 약산화지가 25.1%, 강산화지는 13.6%로 비산화지 48%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산불 발생 한 달 정도 지나 시료가 채취되어 강우 시 탄화물의 침식이나 유실의 발생, 높은 열에 의한 탄화물의 대기로 입자상 유실, 또는 세립상의 탄화물이 광물질 토양에 혼입되어 산화지의 유기탄소 농도가 낮은 값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질소의 경우 강산화지는 0.65%로 비산화지 1.12%나, 약산화지 1.18%에 비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산불발생 동안 고열에 의해 대기로 질소 휘산이 발생하였거나(Murphy et al., 2006), 수관과 유기물층이 소실된 후 재나 탄화물이 광물질 토양에 혼입되어 질소 농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약산화지의 질소농도가 강산화지에 비해 높은 것은 산불 발생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 변색되어 고사한 잎이 탄화물 위로 낙하한 결과로 사료된다. 유기물층의 인 농도는 강산화지가 0.75%, 약산화지가 0.83%으로 비산화지 0.37%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산불 발생 시 유기물층의 인 농도는 유기물층의 소실에 따라 재 속에 포함된 가용성 인과 유기물층의 pH 상승에 따른 인 가용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Certini, 2005; Murphy et al., 2006).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산화지가 비산화지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탄화물이나 재 등에 포함된 염기성 이온이 수용성으로 변화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Certini, 2005).
토양용적밀도의 크기는 강산화지, 약산화지, 비산화지 순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ure 3). 산불피해지의 경우 유기물층의 소실에 따른 표토층의 입단 구조파괴,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는 표토층 유실, 토양층위 깊이 변화, 토양구조의 파괴에 따른 총 공극량 변화 등에 의해 토양 용적밀도의 증가가 관찰된 바 있다(Kim et al., 1999; Neary et 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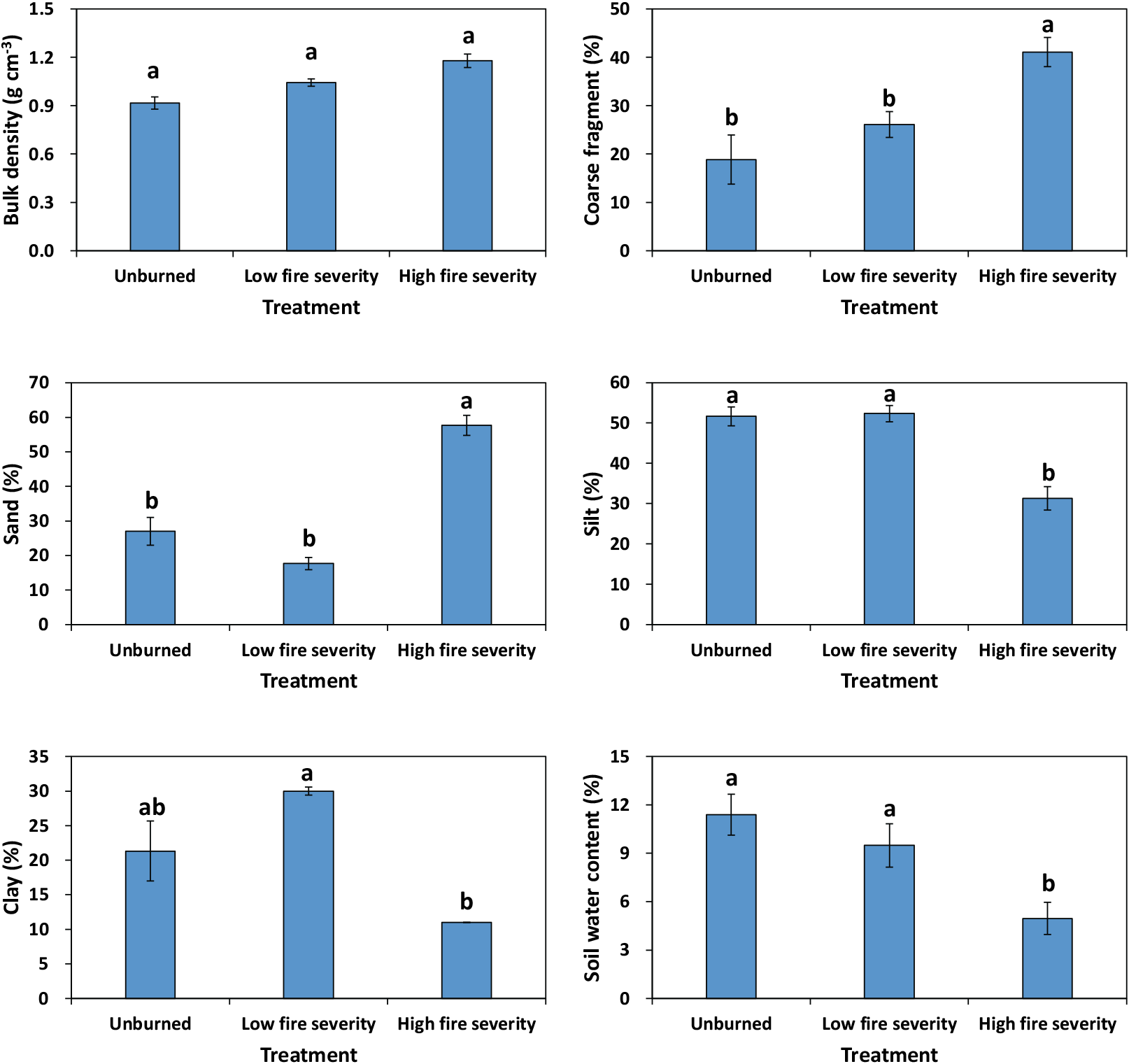
토양 입경분포는 산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Certini, 2005), 지표면의 세립질 입자 유실이나 침식 등에 의해 변화가 발생하여 조립질의 모래 함량이 증가할 수 있다(Kim et al.,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산화지의 높은 모래함량은 산불의 영향보다는 조사구가 점토나 미사 같은 세립질 입자의 용탈이나 세탈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산정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강산화지의 낮은 토양 수분함량은 토양 보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토 함량이 가장 낮았고 수관의 소실 후 지표면에 도달하는 광의 증가로 인하여 증발에 의한 손실이 비산화지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토양 pH는 강산화지가 pH 4.71로 비산화지 pH 4.44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ure 4). 산불발생지의 토양 pH는 유기물층의 탄화 과정 동안 발생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염기성 양이온의 토양 내 유입의 증가(Certini, 2005)와 토양 pH가 낮게 나타나는 부식(humus)층이 산불 발생으로 소실되어 재(ash)로 변환되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Murphy et al., 2006). 국내에서 조사된 산불 발생 일주일 후 소나무 임분의 토양 pH는 대조구에 비해 pH 0.6 단위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에 포함된 염기성 양이온의 유입이 원인이었으나(Kim et al., 1999)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급속히 감소하여 산불 이전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n et al., 2006). Binkley and Fisher(2020)는 산불 발생으로 인한 토양 pH 변화는 유기산의 소모나, 원래 토양의 pH, 질소무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화 작용의 정도, 토양의 완충능, 탄화물이나 재의 양적·질적 성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불 강도는 토양 pH 변화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9). 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화지와 비산화지 사이에 토양 pH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산불 발생 한 달이 경과하여 강우에 따른 교환성 양이온의 세탈이 발생하였거나, 토양 시료 채취 깊이가 10 cm로 타 연구에서의 산불 발생 일주일 후 5 cm 깊이를(Kim et al., 1999; Cha and Shim, 2015)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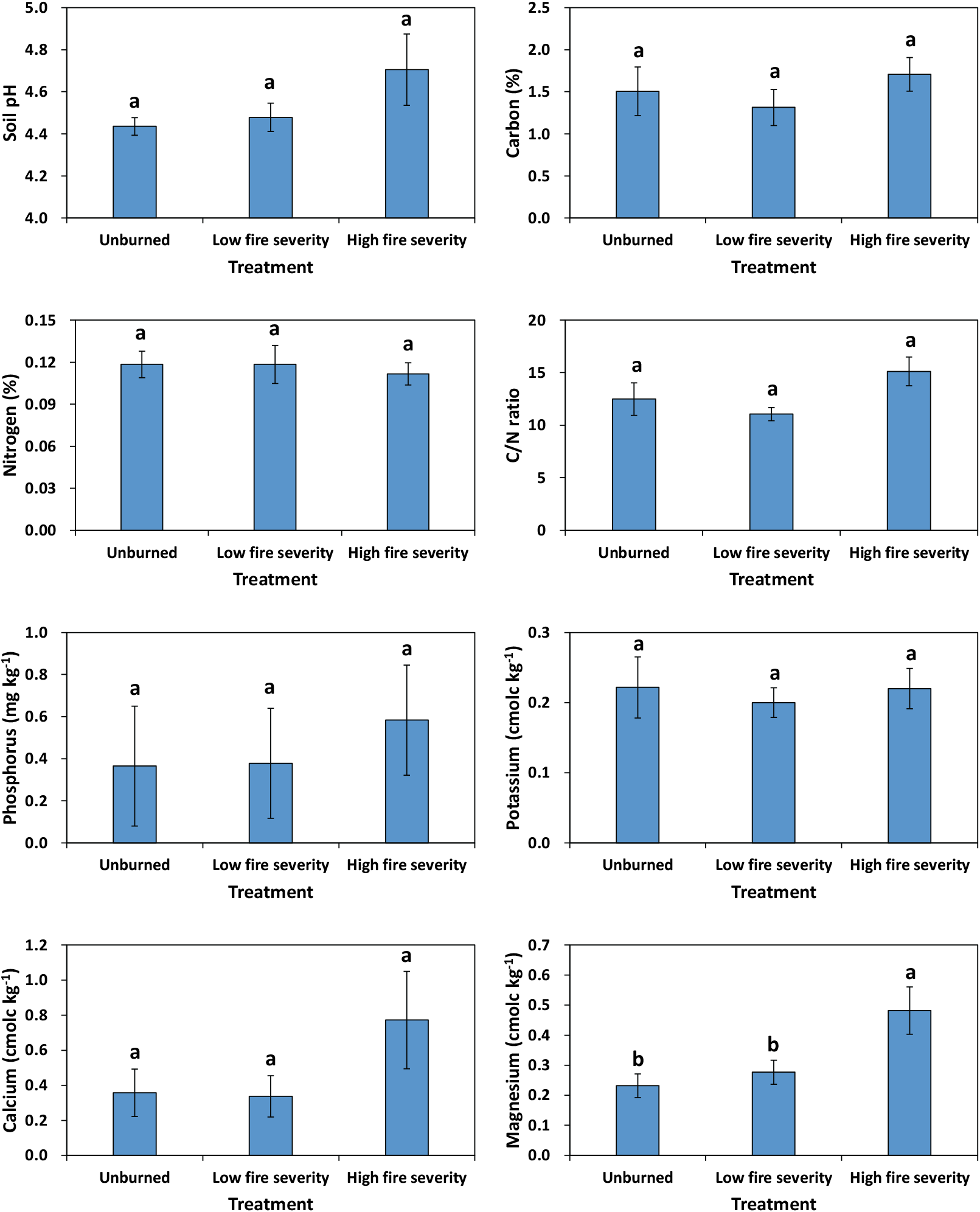
산화지의 토양 유기탄소 농도의 단기적인 변화는 유기물층의 탄화물이나 재 등이 광물질 토양층 내 부가(addition)되는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phy et al., 2006). 본 조사구의 경우 산화지와 비산화지의 토양 유기탄소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산불 발생 후 한 달 정도 경과하여 이들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추후 강우나 바람에 의한 침식 또는 포토층의 유실에 의해 장기적으로 토양 유기탄소 농도의 감소가 예측된다. 본 연구 결과와 대조적으로 산불발생지의 유기탄소 함량은 미국 레지노사소나무 임분(P. resinosa)에서 증가하거나(Alban, 1977), 고열로 인한 유기물의 증류화와 탄화로 유기탄소 농도가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Neary et al., 2005).
토양 질소농도는 토양 유기탄소 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유기물층의 소실로 인하여 강우 발생 시 세탈이나 지표 유거수에 의한 침식, 낙엽낙지 유입량 감소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phy et al., 2006; Binkley and Fisher, 2020). 한편 강산화지의 질소 농도가 낮은 것은 휘산에 의한 손실과 대기로 입자상 방출이 원인으로(Neary et al., 2005) 질소는 200°C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휘산이 된다(DeBano, 1991).
토양 내 인 농도는 산화지와 비산화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산불 발생 후 유효 인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Cha and Shim, 2015). 이러한 증가는 토양 pH의 상승에 따른 인의 유효도 변화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Binkley and Fisher, 2020). 그러나 산불 강도가 강할 경우 휘산에 의한 손실이 보고되기도 하나(Binkley and Fisher, 2020) 본 연구에서는 강산화지와 약산화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 지역 토양 내 유효 인의 농도가 낮은 것은 토양 pH가 낮은 토양 산성화로 인하여 철(Fe)이나 알루미늄(Al)에 의한 고정화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교환성 칼륨은 산화지와 비산화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타 연구에서도 침엽수 임분의 교환성 칼륨 농도는 산불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다(Johnson et al., 2014). 그러나 교환성 칼슘과 마그네슘은 강산화지가 약산화지나 비산화지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산불 발생 후 교환성 양이온의 증가를 보고 하였다(Alcañiz et al., 2018; Agbeshie et al., 2022). 이러한 증가는 유기물층 연소에 따른 탄화물이나 재 속의 염기성 이온의 토양층으로 이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Meyer et al., 2004; Neary et al., 2005; Alcañiz et al., 2018).
토양호흡량은 약산화지가 1.10 μmol m−2 s−1, 강산화지는 1.00 μmol m−2 s−1로 비산화지 2.04 μmol m−2 s−1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ure 5). 토양호흡량은 뿌리로부터 호흡량과 미생물의 호흡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산화지의 토양호흡량의 감소는 임목의 고사와 함께 뿌리 호흡량의 감소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약산화지와 강산화지의 토양호흡량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약산화의 경우에도 상층수관의 피해에 따른 뿌리 활력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Gui et al., 2023). 산화지의 토양호흡은 강산화지에 비해 하층식생의 재생이 활발한 약산화지에서 토양호흡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lly et al., 2021). 그러나 본 조사구는 산불 발생 한 달 후에 측정하여 하층식생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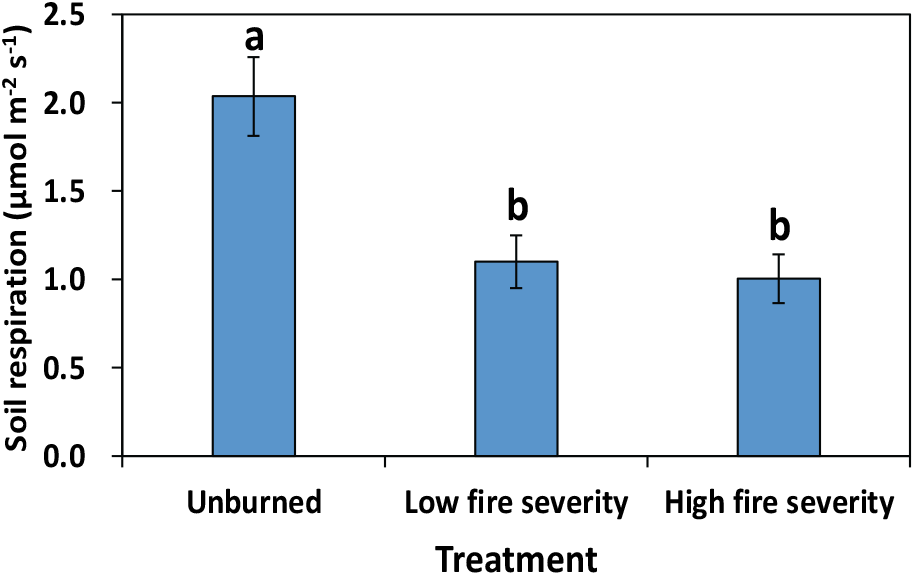
산화지 및 비산화지를 대상으로 토양호흡과 유기물층 및 토양층의 양분 특성 사이에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기물층 특성 변이에 대하여 가로축(Axis 1)은 65.6%, 세로축(Axis 2)은 25.4%, 토양층은 가로축 46.5%, 세로축 32.3%를 설명하였다(Figure 6). 유기물층의 토양호흡은 토양 pH, 유효 인, 교환성 칼륨, 교환성 마그네슘과는 부의 상관(r=−0.47~−0.77), 유기물층 건중량, 유기탄소 농도, C/N비와는 정의 상관(r=0.55~0.58)이 있었다. 유기물층의 토양호흡과 토양 pH 사이 부의 상관관계는 산화지의 경우 유기물층에 염기성 이온인 칼륨이나 마그네슘 농도의 증가와 함께 유기물층 pH가 상승하였으나 토양호흡은 산불 피해목의 고사와 함께 뿌리 호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유기물층의 건중량과 유기 탄소농도 및 C/N비와 토양호흡 사이의 정의 상관은 비산화지의 유기물층 특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토양층은 용적밀도와 부의 상관(r=−0.59)을 보였으나 토양수분함량과는 정의 상관(r=0.53)이 있었다. 토양호흡과 정의 상관을 보인 토양수분함량은 산화지의 경우 유기물층이 소실되어 증발 손실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비산화지는 산화지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고 토양호흡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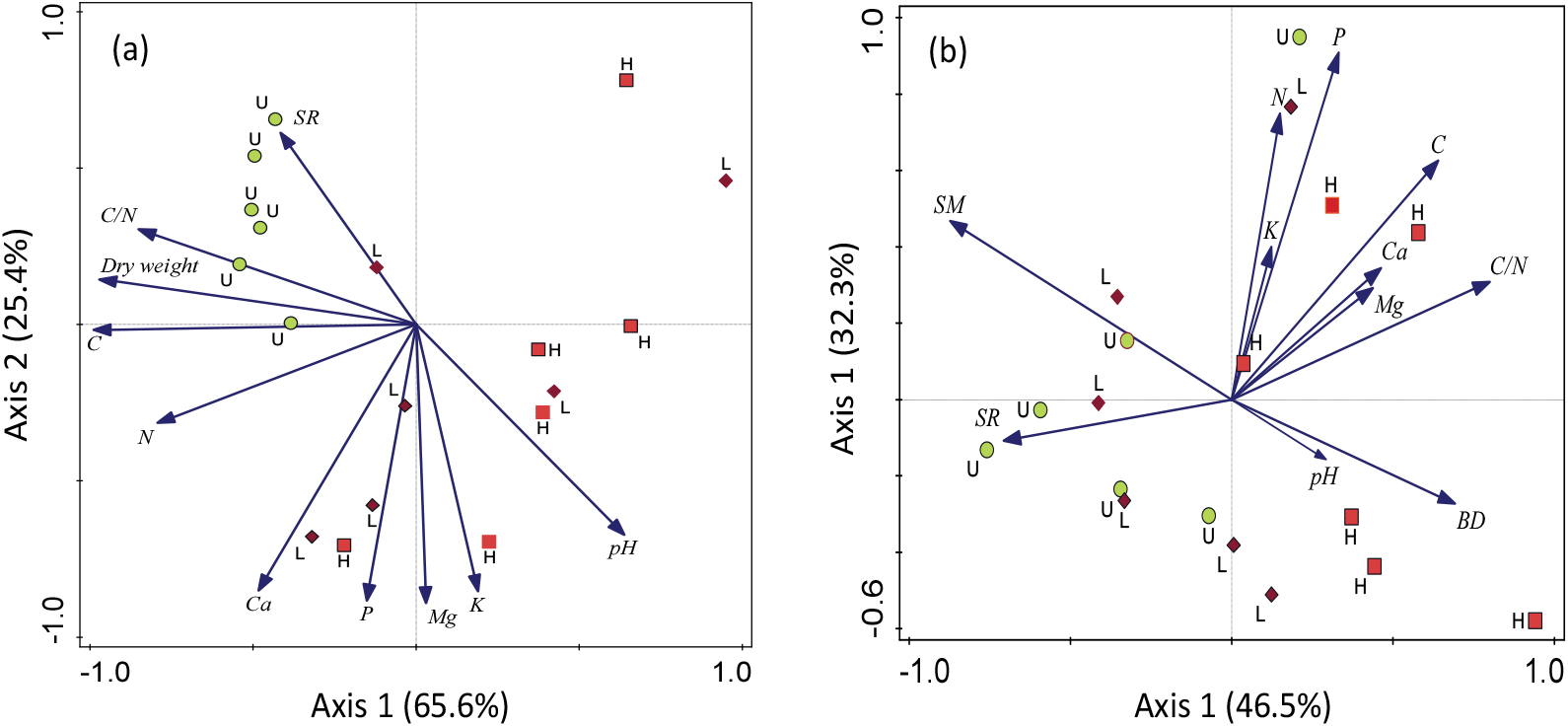
유기물층의 양분 저장량 중 탄소와 질소 저장량은 산화지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저장량은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ure 7). 토양층의 경우 질소, 인, 칼슘, 마그네슘 저장량은 강산화지가 비산화지나 약산화지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유기물층의 탄소 및 질소 저장량이 감소한 것은 휘산이나 광물질 토양의 혼입에 따른 탄소 및 질소 농도의 변화가 주원인이다. 그러나 유기물층 건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화지와 비산화지 사이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저장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탄화물이나 재 속에 포함된 이들 성분의 증가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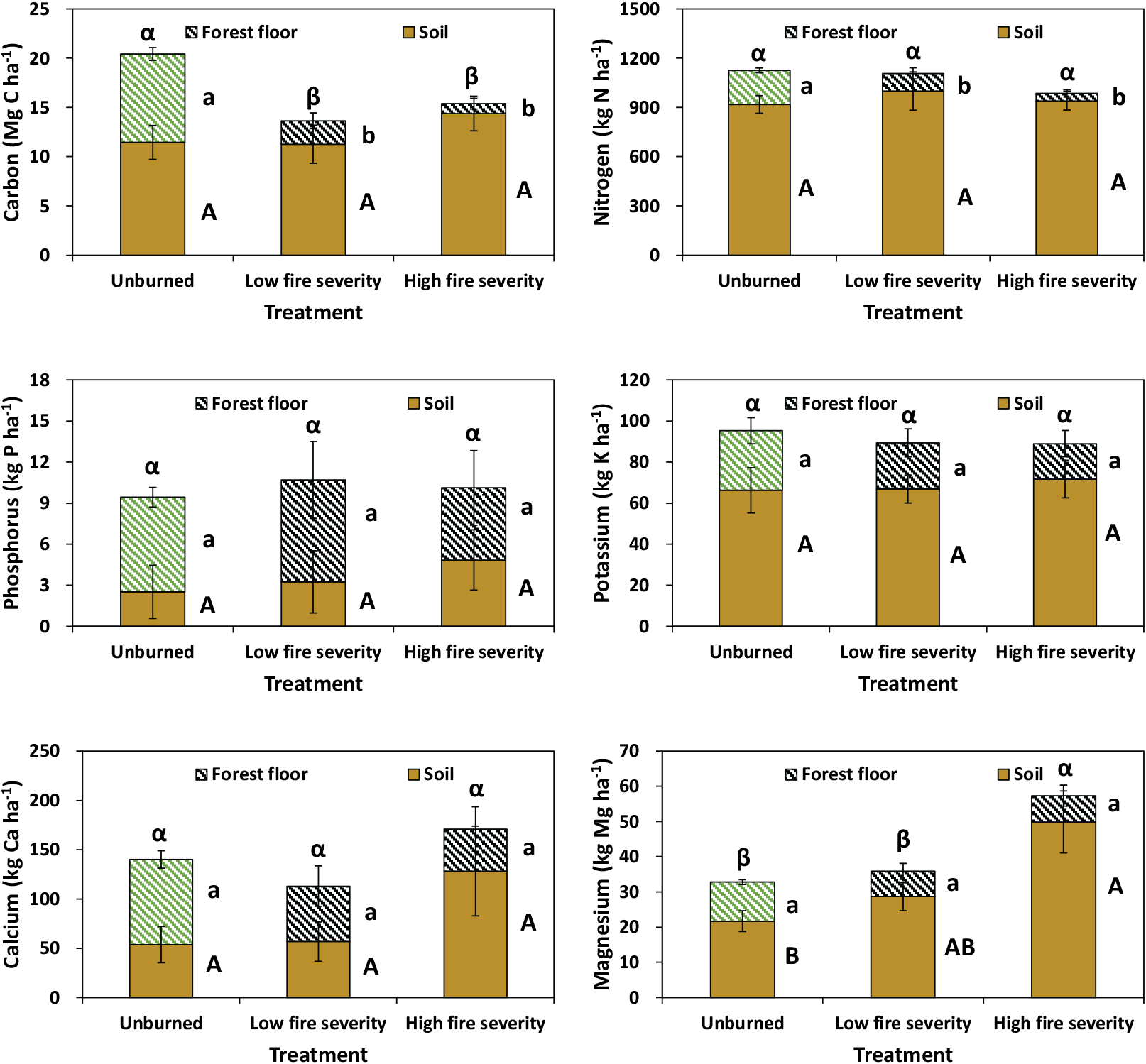
유기물층과 토양 10 cm 깊이의 총 탄소 저장량은 강산화지 13.6 Mg C ha−1, 약산화지 15.4 Mg C ha−1로 비산화지 20.4 Mg C ha−1에 비해 각각 25%와 33% 감소하였다. 질소 저장량은 비산화지 1,125 kg N ha−1, 약산화지 1,107 kg N ha−1, 강산화지 985 kg N ha−1로 비산화지에 비해 약산화지는 2%, 강산화지 12%로 감소하였다. 칼륨도 비산화지 95.3 kg K ha−1에 비해 산화지는 약 6% 정도, 칼슘은 약산화지가 비산화지에 비해 약 19% 감소하였다. 이들 이온과는 대조적으로 인은 대조구에 비해 7~13%, 칼슘은 강산화지가 대조구에 비해 22%, 마그네슘은 약산화지가 9%, 강산화지가 74% 증가하여 양분의 종류에 따라 저장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산화지에서 이들 이온 저장량이 높은 원인으로 유기물 내 칼슘은 1,484°C, 인은 774°C, 칼륨은 760°C 등 높은 온도에서 휘산 되기 때문에(Murphy et al., 2006) 고열에 의한 휘산 손실이 적고, 수관 부위의 소지와 잎 등이 고열에 의해 탄화되고 유기물층에 낙하하여 강우 시 세탈에 의해 광물질 토양층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 론
산불이 발생하고 한 달이 경과 한 소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산불 강도에 따른 양분 농도 및 저장량을 조사한 결과 유기물층의 양분 손실과 증가는 산불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층의 유기탄소와 질소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토양층은 마그네슘 농도의 증가를 제외하고 산화지와 비산화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한편, 강산화지와 약산화지의 토양호흡량은 비산화지의 약 50% 정도로 산불 피해목의 고사에 따른 뿌리 호흡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총 탄소 저장량은 산불 강도와 관계없이 산화지는 비산화지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유기탄소가 산림생산력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토양 인자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산화지의 산림생산력은 감소가 예측된다. 그러나 마그네슘 저장량은 강산화지가 약산화지나 비산화지에 비해 증가하여 수관소실에 따른 잎이나 소지의 탄화물이 임상에 유입된 결과로 사료되나, 질소, 인, 칼륨, 칼슘 저장량은 산화지와 비산화지 사이에 차이가 없어 산불 강도의 영향이 양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 발생에 따른 양분 농도나 저장량의 변화는 유기물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토양층은 그 영향이 크지 않아 추후 산불피해지의 토양 양분 농도나 저장량 조사는 유기물층의 조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산불 발생 후 토양특성 변화는 시·공간적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산림생산력의 변화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